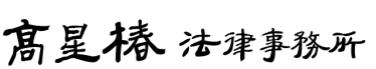이번 노선영 왕따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어느 조직, 어느 공직, 어느 분야든지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류와 비주류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비주류는 서럽다.
그러니 주류가 되려고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위선이다. 현실을 모르거나 현혹시키고자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다.
사람의 본능이 앞서가려고 하지 뒤에 처져서 가려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너는 앞서가라, 나는 뒤따라 가련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이가 몇 있을까 싶다. 더구나 세상살이하는 사람이.
다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눈에는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규정 따로 관행 따로다.
우리나라가 1998년 외환위기로 거덜났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감사를 감사원 재직시 한 적이 있었다.
IMF가 왜 왔을까 궁금했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 결론이 너무 간단했다.
규정은 있어도 뭐가 원칙인 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선배로부터 배웠고, 또 그게 원칙인 줄 알고 후배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관행이 생겼고, 더 굳어지면 고착된 관행이 되었다.
그럴수록 모럴헤저드는 심해졌다.
관행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원칙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룰로 만든 게 규정이다.
규정대로 하면 소수가 힘들고 피곤해진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힘있는 소수는 규정을 아주 싫어한다.
여기서 소수는 주류이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법이 문제다. 인사길목을 꽉 틀어잡고 충성을 요구한다.
충성을 서약하면 승진시켜준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이도 있다. 거부하면 확실히 해코지를 한다.
그러니 쉬쉬하면서 조용히 충성서약을 한다. 그리고 은밀히 승진 등 인사혜택을 본다.
결국 이들끼리 패밀리를 만들어 조직을 장악하고자 한다. 조직이 크면 패밀리가 여럿이다.
그러니 서로들 싸운다.
문제는 사심없이 일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할 뿐이다.
말로만 일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기 마련이다.
시비를 다투기를 좋아하고 선악의 구별은 자기 기준에서 하는 버릇이 있다. 항상 자기는 선의 입장이다.
뻔뻔함과 돈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류가 되면 돈주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러니 돈과 주류는 한몸이다.
주류는 끼리끼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남이가’이다.
관행에 적응하지 못하면 미움을 사게 돼 있다. 관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 주류의 이익을 위해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 이를 무시하고 원칙을 따지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해치지도 않는 무관한 사람도 조직의 관행에 따르지 않으면 ‘카더라’ 통신으로 미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힘없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알아도 침묵으로 일관하기 마련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유분수지. 누가 진짜인지 서로 입을 맞추면 모를 줄 알았나 봐.’
노선영 왕따 논란을 보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빙상연맹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내가 볼 때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감사원 재직시 모 은행을 감사할 때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운용한 은행 앞으로 국가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다.
그때 분명히 알게 된 점은 돈이 무섭다는 것이다.
조직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조직수장을 모시는 사람이 와서 말했다.
“임원들은 얼마든지 잡아도 괜찮으니 손해배상만 하지 말아주십시요.”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조직수장의 이미지에 금이 가고 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빙상연맹을 감사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사람을 쳐내는 것으로는 조직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만 변할 뿐이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으면 돈으로 물어내게 하면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손해배상을 시킬 수 있는 건을 찾아내면 될 듯하다.
고착된 관행이 있는 조직일수록 횡령이나 공금유용 등 감사지적 건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다.
앞으로 공직자들도 이렇게 다뤄야 공직이 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