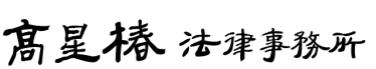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경영자 이야기다.
甲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체납세액이 있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는 개인채무로 1998년 당시로 수 백 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감사원에 있을 때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 있던 경험으로 보면 IMF 당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당시 사후관리팀은 조직의 아웃사이더로서 기피부서였다.
조직에서도 돈을 대출해주는 부서에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생기는 것이지 이미 부도난 회사 시체 처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다보니 내 돈 떼이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으려 하겠지만 은행돈이고 국가돈이다 보니 귀찮은 일에 불과했다.
부도나면 당연기한이익상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부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규정에 의하여 당시 규정에 의하여 적색등록을 시켜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부도회사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다 놓친 후에야 비로소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도난 회사는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신속히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관행은 관행이다.
우리나라 IMF가 온 이유는 ‘규정 따로, 관행 따로’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입사할 때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고,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행에 불과했다면 당연히 금융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게끔 되어있다.
그러니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다고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겠는가? 어느 조직이든 규정대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
왜?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규정대로 하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재량이 없어지는데 아쉬운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오고가는 정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니 조직에 오래 몸담아 이제 관리자가 되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왠지 싫어진다.
정치성이 있어야 한 자리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월급에서 쓰다보면 금새 바닥나기 마련이다.
부실경영자들의 모럴헤저드를 논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런 토양을 만들어준 게 공업(共業)이라면 공업(共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