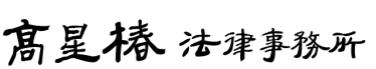부실경영자의 재산 은닉 방법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을 예로 들어본다.
부실경영자 김부실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납부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이다. 김지인은 김부실의 지인(知人)이고, C회사는 김부실의 자녀들인 甲1, 甲2가 그 주식을 각 24%씩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이런 경우다. 재산을 은닉해놓았기 때문이다.
김부실의 재산은닉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김부실은 소유주식을 김지인 명의로 이전한 후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단기간 회사를 운영하다가 주주들에게 액면가의 150%를 지급한 후 회사는 소멸시키고, 지급받은 금액을 제3자 명의를 거쳐 자녀들의 회사로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김부실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체납세액이 있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는 개인채무로 1998년 당시로 수 백 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감사원에 있을 때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 있던 경험으로 보면 IMF 당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당시 사후관리팀은 조직의 아웃사이더로서 기피부서였다. 조직에서도 돈을 대출해주는 부서에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생기는 것이지 이미 부도난 회사 시체 처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 돈 떼이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으려 하겠지만 은행돈이고 국가돈이다 보니 귀찮은 일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부도나면 당연기한이익상실 규정에 의하여 당시 규정에 의하여 적색등록을 시켜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부도회사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다 놓친 후에야 비로소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도난 회사는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신속히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관행은 관행이다.
우리나라 IMF가 온 이유는 ‘규정 따로, 관행 따로’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입사할 때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고,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행에 불과했다면 당연히 금융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게끔 되어있다. 그러니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다고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겠는가? 어느 조직이든 규정대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
왜?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규정대로 하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재량이 없어지는데 아쉬운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오고가는 정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니 조직에 오래 몸담아 이제 관리자가 되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왠지 싫어진다. 정치성이 있어야 한 자리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월급에서 쓰다보면 금세 바닥나기 마련이다. 부실경영자들의 모럴헤저드를 논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런 토양을 만들어준 게 공업(共業)이라면 공업(共業)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보건대, 김부실의 재산은닉방법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관할세무서장이 김부실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김부실 소유 A회사 발행 제1주식을 압류하였음에도 이를 어떤 식으로 해제하여 은닉시킬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다.
김부실은 우선 압류 이전에 주식을 김지인에게 양도했다는 증명을 남기기 위하여 A회사에게 주식양도‧양수 통지를 한다. 김지인은 제1주식을 D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당시 김부실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시킨다. 그리고 김부실은 김지인의 계좌에 제1주식을 입고시키고, 김지인은 위 주식을 양도해서 210억을 만들어 그 중 72억 원을 B회사에 출자하였다.
위 회사의 총 자본금은 85억 원이고 총 발행주식 총수는 170만주였다. 김지인은 그 중 144만주(액면가 5,000원, 제2주식)를 취득하여 B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던 것이다.
B회사는 3년 정도 경영하다가 소액주주들에게 자본환급으로 액면가의 150%로 지급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을 전부 정리하고 곧 페업신고를 하였다.
B회사는 149억 원을 현금화하여 甲1을 거쳐 당일 김부실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C회사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해서 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되어 뺏길 뻔한 재산을 꼭꼭 감출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세청은 김부실의 체납된 부가가치세 외 수십억 원의 국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즉 우선 김부실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부실의 김지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럼으로써 김부실이 김지인 또는 B회사, 자녀들의 회사인 C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또는 순차 대위행사함으로써 국세채권 수십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소제기는 애당초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 법리 자체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부실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김부실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었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각하를 면치 못하였다. 당시 징세과 담당자는 이 사건을 가지고 승진을 하였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윗사람들에게 보고가 되었고 정서적으로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소를 면치 못할 부실한 내용이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도로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안긴 사람들이 국세청 징세과의 추적에 걸릴 정도면 이미 공적자금이 다 회수되었을 것이다.
원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걸리는 사람들은 갑자기 재산을 빼돌리려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 애초부터 재산을 은닉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 법을 알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사해행위에 걸리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오히려 선량한 서민들인지도 모른다. 거래업체가 부도나서 뜻하지 아니하게 체납자가 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라도 가족들 명의로 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미리 작심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