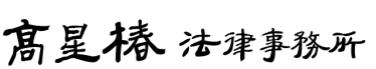갑은 남편을 내조하면서 45년을 살았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고, 고생 끝에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차려 24년 동안 사장을 했기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살만하면 죽는다더니 남편은 갑자기 저승길을 재촉해 길을 떠나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35억 원 정도 되는 상속재산이었다. 세무사는 비과세 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을 모두 공제한 후 14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액으로 4억 원 정도를 산출했다. 그 후 자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4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6000만원을 납부할 상속세액으로 산정했다. 상속인들은 이를 모두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상속재산이 더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무려 1억 5000만원이나 더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왔다. 갑은 너무 놀라 세무사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도 선뜻 설명하지 못했다. “얼른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가 알아본 사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년도 회사 결산서에 퇴직금으로 2억 8000만원이 추계된 후 그 적립금 상당액을 그 해 법인세를 산정하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공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세무서 입장에선 남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누락해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무사의 설명을 들은 갑은 황당한 기분이었다. “아니 내가 남편에게 퇴직금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갑은 애꿎은 세무사에게 짜증을 부렸다.
결국 갑은 세무서로 찾아갔다. “남편은 근로자도 아닌 사장인데 무슨 퇴직금을 받나요?” 세무공무원은 반박했다.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주총결의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임원퇴직금 규정은 이미 주총결의로 제정돼 있으니 남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어머! 언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갑의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담당자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불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갑 입장에선 알지도 못한 퇴직금이 있다 하고,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있다면서 그것도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상속세를 더 내라 하니 용납하기 어려웠다.
갑은 소송까지 갔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상고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결과는 승소였다.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도 승소였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비용은 비용대로, 정신적 고통은 고통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깨졌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세무서장이 또 상고했다. 그러나 다행히 심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6개월 만에 끝났다. ‘이러려고 상고했는지. 도대체 부실과세로 판명되기까지 총 몇 년이 걸려야 하는가.’ 총 5번의 심급을 거쳤다. 내 돈 들여 소송한다면 어느 누가 함부로 계속 상소를 반복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