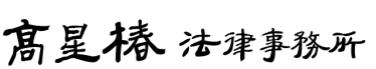부안 월명암(도는 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돈이나 지위를 얻고자 평생 용을 쓰면 살지만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유리병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늙고 병들어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 승속의 구별도 없고 선악의 구별도 없다 한다. 눈에 보여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본성이라고 한다. 참나를 찾는 과정이 그래서 쉽지 않다.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게 인생의 큰 역작이다.
전북 부안을 가면 채석강이라는 관광명소가 있다. 바닷가에 있는 바위 모습이 특이하다. 변산반도를 따라 여러 해수욕장이 즐비하다. 지금도 생각난다. 채석강 바로 앞 바다에서 접영으로 날라다녔던 기억이. 그곳에는 내소사, 직소폭포가 있다. 길과 물이 평행선상에 있는 곳이다. 외변산, 내변산으로 나뉜다. 내변산에는 월명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1997년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었다. 사법연수원 1년 생활을 마무리하던 때였다. 곡성 태안사에서 같이 기도하였던 스님이 서해 변산반도 부안 월명암에 있다고 하였다. 변산은 500미터가 되지 않는 고도가 낮은 곳인데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다. 변산반도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해수욕장도 여러 군데 있지만 채석강, 내소사, 직소폭포로 유명하다. 해수온천도 있다. 이곳은 해가 갈수록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개발을 하는 곳이다. 월명암은 내변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걸어서 약 40분정도 올라가야 한다. 그곳에는 사성선원(四聖禪院)이 있는데 그곳 선방스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상 당번을 정해 여러 수좌들이 내려와 먹을 것을 지게지고 절까지 옮기는 운력을 해야 하는 곳이었다. 지금은 짐을 운반하는 모노레일이 놓아져 있다.
월명암 절도 괜찮지만 그 절에 유래된 설화가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곳에는 사성선원이 있다. 신라시대때 부설스님이 도반 2명과 함께 수행을 위해 금강산으로 가다가 홍수를 만나 부안땅까지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장마기간동안 부안의 부잣집에;서 머물렀다. 장마가 끝나자 길을 갈 채비를 하는데, 그곳 주인이 청을 하나 하였다. 자기 딸 묘화가 스님을 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렸다고. 그러니 남아서 딸과 살아줄 수 없냐고 물었다. 묘화는 스님이 없으면 죽겠다고 하였다. 도반스님들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다. 부설스님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이게 다 전생의 업력이라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생명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도닦는 일을 다음생으로 미룬다 생각하였다. 화운(和韻)이라는 제목의 선시가 바로 그때의 심정을 드러낸 거로 후세사람들은 말한다.
평등한 깨달음은 행에도 차별없네
깨달음은 인연 없는데서 이루지만
제도는 인연 있는데서 이룬다네
진리에 몸 맡겨 세상을 살아가면 마음 또한 없어지고
집에 머물러 도를 이루니 봄이 오히려 만연하도다
둥근 구슬 손바닥에 쥐고 붉고 푸른빛 분별하고
밝은 거울 앞에 대하니 진(眞)과 가(假)가 분명하네
빛과 소리에 걸릴 것 없으니
굳이 깊은 산골에 오래 앉을 필요 없으리 [출처 :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불교설화 중 부설거사)]11
悟從平等行無等 覺契無緣度有緣
處世任眞心廣矣 건家成道體脾然
圖珠握掌丹靑別 明鏡當臺胡漢縣
認得色聲無臺碍 不須山谷坐長連
부설스님은 거사로서 묘화와 살면서 월명, 등명이라는 자식들을 낳았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어느순간 애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자 가족들을 불러 ‘이제 나는 조그만 거처를 지어 수행에 매진하고자 하니 너희들이 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꾸려라’ 하고 지금의 월명암 자리에 터를 잡고 수행정진을 하였다. 지금의 망해사는 부설거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금강산으로 갔던 도반스님들이 부설스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였다. 신라로 내려오는 길에 부설스님을 만났다. 도반들이 찾아오자 부설거사는 기쁜 마음으로 예를 갖춰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며칠후 그들이 길을 떠날 때 도력시험을 해보자고 제의하고 처마에 물을 담은 호리병을 거꾸로 매달아 지팡이로 병을 깨트려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도력을 시험하자고하였다. 두 스님의 병의 물은 흘러 떨어졌지만 부설거사의 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 대목이 나에게 강한 느낌을 주었다.
‘병이 거꾸로 있다고 해서 내 본성이 변할 수 있는가?’
병은 육신을 말하고 물은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육신이 다르다 해서 내 본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느꼈다. 도반스님들은 애욕의 그물에 걸린 부설거사를 얕잡아 봤으나 진리는 옷에 있지 않다는 것을 크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를 갖췄다는 설화가 월명암에 내려온다. 부설거사는 어느 곳에 있든 진리에 몸 맡겨 순리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다.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그런대로 살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러고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시장물건 사고 파는 건 세월 대로
세상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대로 보내네.
此竹彼竹化去竹 風打之竹浪打竹
粥粥飯飯生此竹 是是非非看彼竹
賓客接待家勢竹 市井賣買歲月竹
萬事不如吾心竹 然然然世過然竹
-팔죽시-
부설스님은 다음과 같은 열반송을 남겼다.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듣는 바가 없으니 모든 시비가 끊어졌도다
분별심과 시기심을 다 놓아버리니
다만 마음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할 뿐이라
目無所見無分別
耳聽無聲絶是非
分別是非都故下
但看心佛自歸依
부설거사는 불교역사상 3대거사로 유명하다.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이다. 스님이 아니면서 도를 깨친 사람이다. 도가 스님들의 전유물인가. 오히려 세상살이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절에 가야 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멀리서 찾으려 하고 사람에게 의존한다. 사람을 몰라보고 스쳐가는 도인들이 많다. 바로 자기 옆에 두고서 깊은 산속 오두막까지 찾아가서 도를 찾으니 자신 스스로 환상을 심는다. 아마 그 환상이 깨질 때의 쓰라림과 허탈함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성선원(四聖禪院)은 부설거사와 묘화, 월명, 등명 모두가 이곳에서 도를 깨쳤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그곳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때 뵐 때 그 스님의 나이가 92세였다. 그 나이여도 귀가 먹지 않았다. 사람 말을 다 알아 들었다. 생식을 하면서 혼자 지내는 분이었다. 그 분을 처음 뵐 때 마루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아 저 멀리 산세를 쳐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세파로부터 체념한 아니 해탈한 모습이었다.
난 이 설화를 처음 들으면서 참 인상깊게 와닿았다. 왠지모르게 말이다. 출가의 기로에 서봤기 때문에 부설거사 이야기가 남다르게 느껴졌다. 부설거사 이야기를 아내도 잘 알 정도다.
“지금에서야 부설거사가 했던 말의 의미를 조금씩 느낀다. 세세생생 흐르는 나의 삶이 현재 바람불면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외길을 가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이상 꿋꿋하게 갈 뿐이다. 지금과 예전이 다른 것이 있다면 출가(出家)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오늘도 고마습니다 를 속으로 되뇌이면서 출근을 한다. 마음깊이 happy합니다 라는 말이 우러나온다. 모 감사위원이 했던 말씀이 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야, 젊었을 때 방황해봐야지 언제 해보겠어. 난 그게 방황이라고 안봐. 나도 젊다면 그렇게 해보겠어.” 나의 방황이력을 보면서 국세청 들어올 때 변호사인 면접위원이 물어본 말이었다. “변호사로서 성공하지도 못했네요?”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전 성공한 변호사가 아닌데요” 하루 일과 중 제일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 경북궁산책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원들과 같이 산책을 한다. 오늘은 드디어 개나리가 노란색을 띄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봄이다. 겨울을 겪고 맞이하는 봄이라서 그런지 올해의 봄은 유난히 더 친근하다. 저녁 6시 따앙-따앙- 종소리가 들린다. 조계사에서 들려오는 범종소리다. 저녁예불이 끝나고 잠시 시간을 내어 좌복을 깔고 법당에 잠시 앉아 있었다. 남녀불문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부처님에게 공손히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무슨 인생역정이 있어 저렇게 신심을 낼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가만히 나 자신을 침잠시켜 본다. 왠지 모를 뿌듯한 마음과 평안함을 느낀다. 캘빈의 예정설처럼 모든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절을 좋아하니 직장도 절 옆으로 옮겨준 것 같다. 몇 년 동안의 기억이 아련하게 추억으로만 남는다. 미움도 걱정도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2005년 국세청 재직 당시의 일기다. 부설거사 이야기는 국세청에서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었다. 수송동에 있는 국세청이 수송선방이었다.
요즘은 날마다 대립의 연속이다. 시기질투로 인한 대립부터 이념대립, 종교대립까지 대립하지 않으면 생존의 의미가 없는 이들이 천지다.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해도 남의 흠은 티끌하나 놓치지 않고 잘 본다. 모두들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똑똑한 사람들 천지인데도 세상은 더 분열하고 대립한다. 개인간의 시기 질투 냉소 무시는 물론이고 진영간의 이념대립부터 종교대립까지. 주객이 전도되는 삶이다.
妻子眷屬 森如竹 金銀玉白 積似邱
臨終獨自 孤魂逝 思量也是 許浮浮
가족들이 대숲처럼 번성하고 금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죽음에 이르면 오직 홀로 외로운 넋으로 떠나가니 생각하고 헤아려보면 헛되고 덧없는 일이구나
朝朝役役紅塵路 爵位纔高已白頭
閻王不怕佩金魚 思量也是虛浮浮
날마다 번거로운 세상사에 매달려 권세가 높아지니, 어느새 백발이구나 염라대왕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생각하고 헤아려보면 헛되고 덧없는 일이구나
錦心繡口風雷舌 千首詩經萬戶侯
增長多生人我本 思量也是虛浮浮
아름다운 마음과 뛰어난 글재주 혼을 빼는 말솜씨와 천편의 시와 문장 수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제후의 권력과
세월 속에 제 잘났다고 여겨도 생각하고 헤아려보면 헛되고 덧없는 일이구나
假使說法如雲雨 感得天花石點頭
乾慧未能免生死 思量也是虛浮浮
설법이 뛰어나 구름과 비를 부르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돌조차 감동을 하더라도
껍데기 지혜로는 생사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생각하고 헤아려보면 헛되고 덧없는 일이구나
– 부설거사의 사부시(四浮詩) –